미국으로 이민오기 전, 서울에서 살고 있을 때 이야기다. 대로(大路) 한 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입간판(立看板)에는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을 홍보(弘報)하는 법무부의 슬로건(Slogan)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아래 사람 없다” 아니면 “법은 만인(萬人) 에 평등(平等)”이였고 이런 구호들은 50년도 지난 지금까지 필자의 기억(記憶)에 어제 일인 양 생생하게 각인(刻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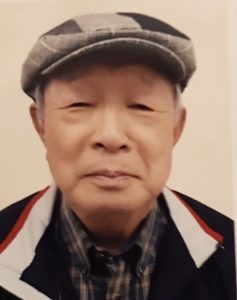
평등은 21세기 문명의 시민사회가 반드시 추구(追求)해야 할 가치(價値)다. 한국의 헌법 제 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는 선언적 조항(宣言的 條項)이 있어 차별을 금지(禁止)하고 있다. 이는 마치 종교의 황금률(黃金律)과도 같은 금과옥조(金科玉條)라 하겠다.
후속 법(後屬 法)인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지금까지 한국 역대 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회 본 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 여러 계층(階層)의 이해가 지뢰밭같이 걸려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옹성(鐵甕城) 높은 벽이 가로 놓여있다는말로 밖에 달리 설명이 어렵다. 사회적 합일(Social consensus)을 이루는 일이 녹녹치 않음을 실감(實感)한다.
1948년12월10일, 이날은 유엔총회가 인권선언문(人權宣言文, Human Rights Declaration)을 채택한 날이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목도(目睹)한 인권 침해사례(侵害事例)들을 토대로 전문 30조의 재발방지(再發防止)를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을 천명(闡明)했으며, 이 선언문은 오늘날 세계 500여개 언어로 널리 소개(紹介)되고 있다. 이 선언문은 구속력(拘束力)은 없지만 인권침해의 기준(基準)을 밝히는 척도(尺度)가 되고 있다.
평등에 관한 사상(思想)은 고대 사회에도 있어온 오랜 화두(話頭)다. 평등이 문제시되는 것은 차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평등의 문제는 80%가 힌두교도(Hinduism)인 인도(印度)에서 특히 두드려진다. 인도에는 힌두교 사제집단인 (교도의 4%) 브라만은 인도 카스트 제도(Caste System)의 정점(頂點)에 있으며, 다음은 크샤트라(귀족과 군인), 다음은 바이샤(상인), 수드라(육체 노동자)며, 말단(末端)엔 불가촉천민 (不可觸賤民, Untouchable) 이 있고, 이 서열은 타고나는 것이다.
고대사회에도 신분제(身分制)는 엄존(儼存)했다. 중국에도, 한국에도, 일본에도, 동남아에도, 유럽에도 사람사는 지구상에는 어디든지 존재해 왔다. 신라의 골품제(骨品制), 이조(李朝)의 사농공상(士農工商), 유럽과 일본의 무사계급(武士階級) 등 그 예는 널려 있다. 이들 신분제는 모두 조직 내 서열(序列)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자생(自生)했다. 조직(組織)은 필연(必然) 계급을 낳고, 계급은 차별을 만든다.
차별은 종교계에도, 인종(人種)간에, 남녀(男女)간에, 주종(主從)간에, 태아(胎兒)를 포함한연령(年齡)간에,지식(知識)과 사상(思想)과 빈부(貧富)간에서도, 전쟁의 와중(渦中)에도, 사회적 약자(弱者)와 강자(强者)간등에서 이해충돌(利害衝突)의 씨앗이 되어왔고 강대국(强大國)과 약소국(弱小國)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흔히 평등에 역행(逆行)하는 듯한 여러 사회적 현상이 발전(發展)과 진보(進步)의이름으로 용인(容認)되는 것을 본다. 좋은 예가 올림픽에서 등수(等數) 매기기, 경진(競進) 행사에서 우열(優劣) 가리기로, 모두는 차별을 부추기며 동조(同調) 할 뿐 아니라 미화(美化)에도 서슴지 않음은 이것이 평등과 궤(軌)를 달리하는 듯하지만 상식(常識)과 공정(fairness)의 훼손(毁損)에 충분히 대응만 한다면 사회발전의 동력(動力)이 되기 때문이다.
반측(反側)에 대응(對應)하는 운동은 왕성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는 절대적(絶對的) 평등은 없었다. 평등은 항상 정의(正義)와 자유(自由)와 인권(人權) 문제들을 동반(同伴)한다.
정의를 상징하는 눈 가린 저울 든 여신(女神)의 모습처럼 정의는 언제나 평등의 좌표(座標)였다. 고대 그리스(Greece)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의를 “법을 지키는 올바른 행동 외에도 평등의 또다른형태로 파악”했는데 이는 평등을 법률적으로 이해했지만, 현대에는 이를 배분(配分) 등 약자에 대한 배려(配慮, 베풂)로 확대 해석한다.
평등은 민주주의의 속살이다. 평등을 통한 공존(共存)에 인류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박영남의 수요칼럼N] 새롭게 출범하는 달라스 한인회에 바란다](https://texasn.com/wp-content/uploads/2021/12/05345185-9C00-4C2D-92B2-013D2B02C312-750x375.jpeg)










![[속보] 달라스 한인타운 한인미용실 ‘헤어월드’ 총기난사](https://texasn.com/wp-content/uploads/2022/05/CC6BAD46-AF55-4C8D-B417-A54382F2D733-120x86.jpeg)
![[1보] 달라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 해피데이 한인 여주인 사망](https://texasn.com/wp-content/uploads/2023/04/Screen-Shot-2023-04-04-at-12.11.34-PM-120x86.png)
![[단독] 한인 여직원 폭행한 킬린 스시집 한인업주 … “깨진 맥주병으로 턱 찔러”](https://texasn.com/wp-content/uploads/2022/07/imagejpeg_0-120x86.jpg)


![[속보] 달라스 경찰국 브리핑 … “증오범죄 맞다”](https://texasn.com/wp-content/uploads/2022/05/7CBB4A96-8B9B-40E4-871C-6C2B359E9DA8-120x86.jpeg)










